오피니언
콘텐츠 영역
이슈인사이트
총 55건
검색기간
~
선택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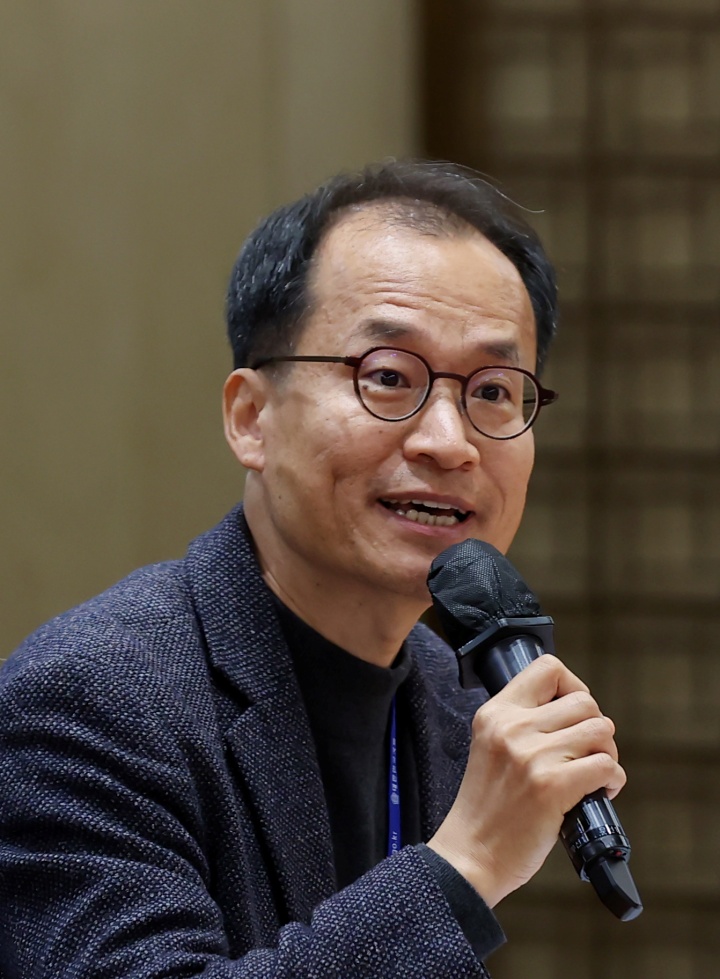 '5극3특', 초광역 협력 기반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수도권에 역전된 이후 2022년 기준 47.5%까지 떨어졌다. 인구의 50.8%, 국가 RD 예산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존의 지역 특화·경쟁 방식만으로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필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5극3특'을 중심어로 삼아 이번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정책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시도 간 협력과 통합 논의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단위가 17개 광역시도에 머물면서 시도 간 분절과 경쟁 구조가 굳어졌다. 시도 차원에서는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구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역에 지정되어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된 사업 체계는 조정보다는 중복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정부지방정부산학이 함께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투자, 창업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을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해온 특화산업 정책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각 지역의 내생적 역량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 산업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지역혁신체제(RIS) 모형이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약 30년간 정부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된 균형성장 정책의 결과,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지원 정책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라는 '원심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재와 기업의 '구심력'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 클러스터는 해당 분야 기업과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문화와 분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가 필수적이다. 기업과 인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공간에서만 지식 이전·교류·혁신·창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이 높고 가치사슬이 복잡해 '결정적 규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최근 강조되는 '메가시티' 역시 도시 간 연결·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정적 규모'가 필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첨단산업 인재들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이직하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평균 2~3년마다 이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인재의 이동을 통한 지식·기술의 확산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인재는 우수 기업과 동료가 밀집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며, 첨단기업 역시 인재가 밀집한 지역에 입지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강화하는 '구심력'을 강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국제공항 등 혁신 자산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도도 높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수행하여 왔다.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수도권은 하나의 메가시티로써 매끄럽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심력'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수도권의 구심력을 비수도권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다.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산업을 묶고, 중앙광역기초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정합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에는 △인재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규제혁신 △RD·실증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5대 패키지가 포함된다. '5극3특'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생활권도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부처별 지역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다.
'5극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먼저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과거와 같은 지방정부 간 경쟁과 중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큰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광역권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정체계가 여전히 광역시도 단위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차원의 추진 동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재가 새로운 균형성장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공유하고 실제 전략산업별 특화된 지역을 입지와 정착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며, 정부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와 추동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간이 '5극3특'을 새로운 균형성장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면 비수도권 GRDP를 5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의 다중심축이 구축된다면 3%대 성장률 회복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2025.11.21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5극3특', 초광역 협력 기반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수도권에 역전된 이후 2022년 기준 47.5%까지 떨어졌다. 인구의 50.8%, 국가 RD 예산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존의 지역 특화·경쟁 방식만으로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필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5극3특'을 중심어로 삼아 이번 전략의 의미와 필요성, 핵심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광역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정책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시도 간 협력과 통합 논의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단위가 17개 광역시도에 머물면서 시도 간 분절과 경쟁 구조가 굳어졌다. 시도 차원에서는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구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부상했으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전역에 지정되어 기업·투자 유치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절된 사업 체계는 조정보다는 중복으로 이어졌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은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쟁을 넘어 '5극3특'(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정부지방정부산학이 함께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을 선정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투자, 창업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을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전략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방거점성장 투자를 위해 2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4% 확대된 규모이다. 이 예산안에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전년 대비 3배 증대한 10조 6000억 원과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9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해온 특화산업 정책의 흐름 위에 서 있다. 각 지역의 내생적 역량과 산업 구조에 맞추어 산업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산업 클러스터 이론과 지역혁신체제(RIS) 모형이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약 30년간 정부광역시도 단위로 추진된 균형성장 정책의 결과,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지원 정책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라는 '원심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재와 기업의 '구심력'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 클러스터는 해당 분야 기업과 기관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이며,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문화와 분화를 통해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창업과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화·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가 필수적이다. 기업과 인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한 공간에서만 지식 이전·교류·혁신·창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이 높고 가치사슬이 복잡해 '결정적 규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최근 강조되는 '메가시티' 역시 도시 간 연결·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결정적 규모'가 필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첨단산업 인재들은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이직하며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평균 2~3년마다 이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인재의 이동을 통한 지식·기술의 확산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인재는 우수 기업과 동료가 밀집한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며, 첨단기업 역시 인재가 밀집한 지역에 입지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과 인재의 집적을 강화하는 '구심력'을 강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경기도는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국제공항 등 혁신 자산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재정 자립도도 높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수행하여 왔다.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수도권은 하나의 메가시티로써 매끄럽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심력'은 이와 같은 요소들이 결합해 형성되고 강화되었다.
'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수도권의 구심력을 비수도권에서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다. 초광역권 단위로 전략산업을 묶고, 중앙광역기초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통해 정합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에는 △인재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규제혁신 △RD·실증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 5대 패키지가 포함된다. '5극3특' 권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생활권도 확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기존 부처별 지역사업은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다.
'5극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먼저 초광역권 단위에서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 과거와 같은 지방정부 간 경쟁과 중복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해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큰 방향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광역권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행정체계가 여전히 광역시도 단위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권 차원의 추진 동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인재가 새로운 균형성장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공유하고 실제 전략산업별 특화된 지역을 입지와 정착지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며, 정부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책 추진을 통해 강력한 의지와 추동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간이 '5극3특'을 새로운 균형성장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한다면 비수도권 GRDP를 50%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5극3특'의 다중심축이 구축된다면 3%대 성장률 회복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2025.11.21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믿은 연대 정신…한-아프리카가 보여줄 기회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 피세하 경성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서론적 관점
1951년, 스물한 살이었던 제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카그뉴(Kagnew) 대대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 군복 한 벌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뿐이었다.
3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한국의 언어도, 사람도, 지리도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은 있었다. 어디에서든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의 문제라는 신념이었다. 그 믿음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고, 훗날 제 삶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에티오피아 카그뉴(Kagnew) 대대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교수의 할아버지 모습.(사진=이스라엘 교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십 년이 흐른 뒤, 나는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고, 현재 부산 경성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로 경험했던 한국은 어느새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됐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인연은 개인적인 소속감으로 이어졌다. 매 학기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맞이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건넜던 그 다리가 단지 군사적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가계(家系)의 기억과 책임감을 안고 나는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이다. 아프리카와 한국, 두 대륙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번 회의는 단순히 국제행사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세계 중심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는 약 14억 8000만 명이며, 2050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균 연령이 19세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혁신, 문화 산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세계 최대의 참여국 수를 자랑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이 숫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로, 경제학자들은 이미 한국을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 여력이 큰 아프리카는 한국과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성장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지역사회는 이미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자조와 협동, 주민 주도의 변화는 가난과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실천 가능한 모델로 작용한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닌 협력의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세계 시장·기후 대응·혁신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은 한국아프리카 협력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과 상생 번영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위상은 더 이상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따르면, 2023년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은 3.2%, 2025년에는 4.1%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오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가 대륙 GDP에 1800억 달러를 더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이로비, 라고스, 키갈리, 아크라 등 주요 도시에서는 모바일 금융,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청년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 분야는 모두 한국이 오랜 기간 경험과 기술적 경쟁력을 쌓아 온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한국의 경험과도 깊게 맞닿아 있다. 한국은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연자원보다 사람과 교육, 집단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술국가로 성장해 왔다. 아프리카에서도 2024년 기준 세계은행 추산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다. 이 인구학적 에너지가 적절한 파트너십과 기술·역량 개발과 결합될 때 글로벌 혁신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한국에게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포용적 세계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 통신,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각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AfCFTA가 열어 주는 54개국 단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진출 수준은 아직 출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조업 경쟁력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은 보다 활발한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교육과 인재교류에도 구현된다. 매년 더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내가 강의하는 교실에 앉아 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대학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아프리카 관계를 잇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익히는, 말 그대로 두 대륙을 연결할 '미래의 다리'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국 포용적 성장은 전환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고난을 딛고 성장해 온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러한 목표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동반자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상생의 방향을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 갈 중요한 계기다.
기후 회복력·녹색 파트너십·지속가능성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그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특히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일수록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미만만을 차지하지만, 동아프리카의 장기 가뭄, 남부 아프리카의 초강력 사이클론, 다카르에서 다르에스살람에 이르는 해안 도시들의 해수면 상승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식량 안보, 이주(인구 이동), 지역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 강한 태풍과 예측하기 어려운 계절 변화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런 공동의 취약성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 준다. 한국도, 아프리카도 혼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공동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잠재력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치된 설비는 전 세계의 1% 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지구 전체 탄소 감축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 한국은 태양광,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수자원 관리 등에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긍정적인 협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미니그리드 구축, 디지털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연안 보호 인프라 등에 참여하며 현지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전략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프리카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현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파트너 정신이다. 이것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켜 온 가치이기도 하다.
기후 회복력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에게 지속가능성은 환경 의무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G20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더 녹색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혁신, AI,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일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접근성의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G20의 세 번째 세션이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디지털 미래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를 나누는 벽이 돼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는 202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6억 1500만 명에 이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7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스, 나이로비, 키갈리와 같은 도시는 핀테크, AI 기반 헬스케어, 의약품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실험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강점과 연결된다. 삼성전자는 남아공·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케냐 등에서 ICT·엔지니어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청년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동·남부 아프리카에 제조 및 혁신 거점을 확대하며 현지 일자리와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기차 조립, 모빌리티 솔루션, 교통 안전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투자나 수출을 넘어 아프리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급증하는 아프리카의 청년 인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한국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AI·친환경 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산학협력 등을 통해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공정성, 포용을 중심에 둔다. 이 논의에서 아프리카는 주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세기를 규정할 AI 규범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공동 설계자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온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열린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결국 혁신이란 기계나 알고리즘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부산의 강의실에서 나이로비의 스타트업 허브에서 함께 협력할 때 G20이 지향하는 미래(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강화하고 대륙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상호 이익,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마주한 협력의 가능성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반하한 현실적인 과제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 인재풀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경제 구조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는 교육·기술·정책 경험을 가진 파트너를 통해 자국의 발전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다.
올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를 처음으로 주최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을 지닌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기적같이 성장한 한국에게도,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가 단지 가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실질적인 연결고리는 이미 하나둘씩 쌓여 가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과 연구, K-컬처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 그리고 기후·일자리·보건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논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야말로 어떤 정책 문서보다 단단한 협력의 토대다.
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는 한국어 한마디 모른 채, '멀리 있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 하나로 바다를 건넜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군인이 아닌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두 대륙을 오가며 지식과 공감, 연대를 잇는 또 다른 다리를 놓고 있다.
곧 시작될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국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다음은 이스라엘 피세하 교수의 영어 버전 칼럼 전문.
Opening Perspective
When my grandfather, barely twenty-one, arrived in Busan in 1951 as part of the Ethiopian Kagnew Battalion, he carried nothing more than a soldier's uniform, a sense of duty, and the hope that his small act of courage might help protect a distant nation he had never seen. Before that three-week journey across the sea, he did not know the language, the people, or the land he would soon defend. Yet he felt an unmistakable convictionif peace was threatened anywhere, it mattered everywhere.
That conviction shaped the course of his lifeand eventually, mine. Decades later, I found myself walking through the streets of Korea as a scholarship student, and now as a professor at Kyungsung University. The country my grandfather once entered as a war zone has become my second home, a place where unexpected historical ties have grown into personal belonging. Every time I teach international students or welcome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nto my classes, I am reminded that the bridge my grandfather crossed was not only militaryit was profoundly human.
It is with this sense of lineage and responsibility that I look toward the upcoming G20 Summit in Johannesburg. This year marks the first time the G20 will convene on African soil, under the theme "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 For someone whose family story spans both continents, the symbolism is not abstract. It reflects a growing recognition that global leadership must evolve to match the shifting realities of our world.
Africa today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n the planet. With 1.48 billion peoplea number projected to nearly double by 2050and a median age of just 19, it is the most youthful continent on ear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ore than 60% of its population is under 25, forming a rising generation that is driving entrepreneurship, digital innovation, and cultural creativity at remarkable speed. Meanwhile,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now the largest free-trade area by participating countriesis reshaping economic integration across 54 member states.
These figures are far more than statistics. They represent the emerging global landscape that Korea will increasingly interact withespecially as Korea navigates one of the world's fastest demographic declines. As Korea enters what economists call a "super-aged society," Africa's young and expanding population stands not as a contrast, but as a complement: two regions whose strengths can reinforce each other, if approached with respect and a long-term vision.
Korea's own development story offers another point of resonance. Many African leaders and communities continue to study the Saemaul Undong, the grassroots movement that transformed rural Korea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self-help, and shared responsibility. What moves them is not a technical formula, but a lived example of how a nation once marked by poverty and war rebuilt itself through collective determination. As someone who teaches and researches across both histories, I often witness how these stories spark hope and imagination among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arrives at a moment when both continents stand at meaningful crossroads. Korea is searching for new engines of growth and broader global partnerships, while Africa is emerging as a decisive actor in global markets, climate responses, and innovation. The summit's theme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is therefore not simply a diplomatic slogan. It captures the deeper potential of KoreaAfrica cooperation, grounded in history, shared values, and a future that both sides are increasingly called to shape together.
Inclusive Growth Shared Prosperity
As the global economy undergoes profound shifts, Africa's increasing role is impossible to overlook. According to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continent's overall GDP grew by 3.2% in 2023 and is projected to rebound to 4.1% by 2025, outpacing many advanced economies. Even more striking is the rise of Africa's digital economy, which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stimates will add $180 billion to the continent's GDP by 2025. Across major hubs like Nairobi, Lagos, Kigali, and Accra, young developers and entrepreneurs are building solutions for mobile finance, renewable energy access, transportation, and educationindustries in which Korea possesses deep experience and cutting-edge expertise.
These economic transformations resonate deeply with Korea's own journey. Korea moved from a post-war economy to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technological nations in just a few decades. Its development was not driven by natural resources, but by people, education, and collective resilience. Today, Africa is experiencing a similar surge of human capital, with over 11 million young Africans entering the labor market every year (World Bank, 2024). This demographic momentum, if matched with the right partnerships and skills development, will shape the world's future innovation landscape.
For Korea, cooperation with Africa is not only a matter of economic opportunity but a strategic investment in inclusive global growth.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active in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across Africa. Yet the potential remains far greater than the current scale of engagement. The AfCFTA creates a single market of 54 countriesa scale Korean enterprises have rarely encountered outside of large regional blocs. With Korea's strengths in digital government, smart cities, green mobility, and manufacturing, the conditions are ripe for mutually beneficial expansion.
The spirit of inclusive growth also extends to education and talent exchange. Every year, a growing number of African students choose Korea for higher education, including many of my own students at Kyungsung University. Their presence enriches Korean classrooms, expands cultural understanding, and builds long-term bridges between societies. These young peoplefluent in both African realities and Korean innovationare the human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Supporting them is not only an act of solidarity; it is an investment in Korea's own global future.
Ultimately, inclusive growth is about ensuring that no nation is left behind in moments of global transition. Korea and Africa, each with their own histories of overcoming hardship, are natural partners in this effort. The G20 Summit offers a timely opportunity to strengthen this partnership, ensuring that economic progress is shared widely and equitably across continents.
Climate Resilience, Green Partnership Sustainability
Climate change is no longer a distant threatit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century. Its impacts are felt unevenly across the world, often striking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first. Africa, despite contributing less than 4% of global carbon emissions (UN Environment Programme, 2023), bears some of the heaviest consequences: prolonged droughts in the Horn of Africa, devastating cyclones in Southern Africa, and rising sea levels threatening coastal cities from Dakar to Dar es Salaam. These climate pressures affect food security, migration patterns, and the stability of entire regions.
Korea is not immune to these effects. Record-breaking heatwaves, intensified typhoons, and shifting seasonal patterns have become part of Korea's new climate reality. In this shared vulnerability lies a powerful truth: neither Korea nor Africa can face the climate crisis alone. Sustainability must b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the G20especially one held on African soiloffers a crucial forum for forging partnerships based on empathy, innovation, and mutual survival.
Africa possesses immense renewable energy potential.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stimates that the continent holds 60% of the world's best solar resources, yet only 1% of installed solar capacity is located there. Unlocking this potential would not only support Africa's development but contribute meaningfully to global carbon reduction efforts. Korea, with its expertise in solar technologies, green hydrogen, smart grids, and water management, is well-positioned to work with African nations in building climate-resilient societies.
There are already encouraging examples. Korean companies have partnered with African governments on solar mini-grid systems, digital climate monitoring, and coastal protection initiatives. Korea's Green New Deal and carbon-neutrality commitments also provide a policy framework that aligns naturally with Africa's climate priorities. But beyond technology and investment, what Africa often seeks is a partner that listens, respects local knowledge, and builds togethervalues deeply embedded in Korea's own experience of development.
Climate resilience is ultimately about protecting human lives and future generations. For Koreans facing demographic decline, and Africans shaping the world's youngest population, sustainability represents not only environmental duty but a promise that tomorrow will be livable, equitable, and shared.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is a reminder that the climate struggle connects our destinies, urging Korea and Africa to walk side by side toward a greener and more resilient future.
Innovation, AI, Quality Jobs the Future of Work
As the global economy enters an AI-driven era, the gap between those who can access new technologies and those who cannot is becoming a new form of inequality. The G20's third sessionfocused on innovation, quality jobs, and a fair digital futuretouches a core truth: technology must serve people, not divide them. For Korea and Africa alike, this challenge is not theoretical. It is already shaping classrooms, workplaces, and the dreams of young people.
Afric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regions for digital adoption. According to the GSMA, the number of mobile internet users in Sub-Saharan Africa will reach 615 million by 2025, with smartphone adoption expected to surpass 75%. Cities like Lagos, Nairobi, and Kigali are emerging as vibrant innovation hubs, home to fintech pioneers, AI-driven health platforms, and drone delivery systems for medical supplies. This transformation aligns closely with Korea's own strengths in digital governance, smart manufacturing, and advanced research.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planted early seeds of this partnership. Samsung Electronics operates training academies in South Africa, Nigeria, Ethiopia, and Kenya, equipping thousands of young people with ICT and engineering skills. LG Electronics has expanded its innovation centers and manufacturing hubs across East and Southern Africa, supporting local jobs and technology transfer. Hyundai Motor Group collaborates with African institutions on mobility solutions, electric vehicle assembly, and safety training.
These initiatives are not only business endeavorsthey represent Korea's growing investment in Africa's technological future.
At the same time, Africa's demographic strengthits expanding youth populationoffers Korea something it increasingly lacks: a future workforce that is creative, ambitious, and globally connected. For Korean companies facing talent shortages at home, deeper cooperation with African partners can create pathways for mutual benefit: internships, joint research programs, vocational training in AI and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y-based skill exchanges.
Korea's "Global AI Basic Society" vision, introduced at APEC and carried into the G20, offers a framework where AI development centers human dignity, fairness, and inclusion. Africa must be part of this conversationnot as a peripheral participant but as a co-author of the digital norms that will shape the next century. Korea, with its experience of building an innovation ecosystem from limited resources, can walk alongside African nations in ensuring that the digital future remains open, fair, and empowering for all.
Innovation is not only about machines or algorithmsit is about giving young people the chance to imagine a better life. When Korean and African youth collaborate, whether in a classroom in Busan or a tech hub in Nairobi, they create the kind of shared future this G20 seeks to envision: a world where technology expands opportunity, strengthens dignity, and builds bridges across continents.
Mutual Benefits, Shared Future
As Korea and Africa stand before a rapidly changing global landscape, th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re not abstractthey are concrete, mutually beneficial, and deeply human. Korea gains access to new markets, new partners, and new sources of talent at a time when its ow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require fresh ideas and global connectivity. Africa gains a partner with hard-earned development experience, advanced technologies, and a record of rising from adversity through education, innovation, and collective will. Both sides gain a friend that understands the value of resilience.
This year's G20 Summit in Johannesburg brings these opportunities into clearer focus. It is more than a diplomatic gathering; it is a symbolic turning point. For the first time, Africa's voice will host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economic forums. And for Korea, whose history includes memories of war, poverty, and miraculous transformation, this summit is a reminder that solidarity is not simply a valueit is a responsibility rooted in lived experience.
The threads that connect Korea and Africa are growing stronger every year. Korean companies are expanding in African markets; African students are learning, researching, and dreaming in Korean universities; cultural exchanges are deepening understanding; and shared challengesfrom climate change to job creationare awakening shared purpose. These human connections, far more than any policy document, form the real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I often think of my grandfather when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this partnership. He crossed oceans without knowing a single word of Korean, believing that defending peace in a distant land was worth the hardship. More than seventy years later, I cross these same lands not as a soldier, but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building bridges of knowledge, empath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ntinents that shaped my family's story.
As the G20 begins in Johannesburg, I hope Korea and Africa seize this moment to deepen their partnershipnot as donor and recipient, not as distant regions, but as equal partners walking toward a sustainable, dignified, and shared future. That is the spirit of solidarity my grandfather believed in, and the spirit that can guide the next chapter of KoreaAfrica cooperation.
2025.11.20
이스라엘 피세하 경성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믿은 연대 정신…한-아프리카가 보여줄 기회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 피세하 경성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서론적 관점
1951년, 스물한 살이었던 제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카그뉴(Kagnew) 대대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은 군복 한 벌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뿐이었다.
3주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한국의 언어도, 사람도, 지리도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은 있었다. 어디에서든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의 문제라는 신념이었다. 그 믿음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꿨고, 훗날 제 삶의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에티오피아 카그뉴(Kagnew) 대대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교수의 할아버지 모습.(사진=이스라엘 교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십 년이 흐른 뒤, 나는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했고, 현재 부산 경성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로 경험했던 한국은 어느새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됐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인연은 개인적인 소속감으로 이어졌다. 매 학기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을 맞이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건넜던 그 다리가 단지 군사적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가계(家系)의 기억과 책임감을 안고 나는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이다. 아프리카와 한국, 두 대륙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번 회의는 단순히 국제행사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세계 중심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는 약 14억 8000만 명이며, 2050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균 연령이 19세에 불과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기업가 정신과 디지털 혁신, 문화 산업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세계 최대의 참여국 수를 자랑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빠르게 바꾸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이 숫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환경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로, 경제학자들은 이미 한국을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 여력이 큰 아프리카는 한국과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성장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지역사회는 이미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있다. 공동체 중심의 자조와 협동, 주민 주도의 변화는 가난과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실천 가능한 모델로 작용한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지닌 협력의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폭넓은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세계 시장·기후 대응·혁신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은 한국아프리카 협력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과 상생 번영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위상은 더 이상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따르면, 2023년 아프리카 전체 GDP 성장률은 3.2%, 2025년에는 4.1%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오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 디지털 경제가 대륙 GDP에 1800억 달러를 더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이로비, 라고스, 키갈리, 아크라 등 주요 도시에서는 모바일 금융, 재생에너지, 교통,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청년 개발자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 분야는 모두 한국이 오랜 기간 경험과 기술적 경쟁력을 쌓아 온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한국의 경험과도 깊게 맞닿아 있다. 한국은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연자원보다 사람과 교육, 집단적 회복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술국가로 성장해 왔다. 아프리카에서도 2024년 기준 세계은행 추산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다. 이 인구학적 에너지가 적절한 파트너십과 기술·역량 개발과 결합될 때 글로벌 혁신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한국에게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포용적 세계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프라, 통신,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각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AfCFTA가 열어 주는 54개국 단일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진출 수준은 아직 출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조업 경쟁력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은 보다 활발한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교육과 인재교류에도 구현된다. 매년 더 많은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내가 강의하는 교실에 앉아 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대학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아프리카 관계를 잇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한국의 기술과 제도를 익히는, 말 그대로 두 대륙을 연결할 '미래의 다리'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국 포용적 성장은 전환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고난을 딛고 성장해 온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러한 목표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동반자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상생의 방향을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 갈 중요한 계기다.
기후 회복력·녹색 파트너십·지속가능성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다. 그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특히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일수록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미만만을 차지하지만, 동아프리카의 장기 가뭄, 남부 아프리카의 초강력 사이클론, 다카르에서 다르에스살람에 이르는 해안 도시들의 해수면 상승 등 가장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식량 안보, 이주(인구 이동), 지역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 강한 태풍과 예측하기 어려운 계절 변화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런 공동의 취약성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 준다. 한국도, 아프리카도 혼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공동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가진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잠재력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치된 설비는 전 세계의 1% 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줄이는 일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지구 전체 탄소 감축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 한국은 태양광,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수자원 관리 등에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미 여러 긍정적인 협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미니그리드 구축, 디지털 기후 모니터링 시스템, 연안 보호 인프라 등에 참여하며 현지 정부와 손을 잡고 있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후 전략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프리카가 한국에 기대하는 것은 현지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설계하는 파트너 정신이다. 이것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켜 온 가치이기도 하다.
기후 회복력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에게 지속가능성은 환경 의무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약속'이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G20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더 녹색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혁신, AI,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의 일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접근성의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G20의 세 번째 세션이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디지털 미래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를 나누는 벽이 돼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는 202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6억 1500만 명에 이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7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스, 나이로비, 키갈리와 같은 도시는 핀테크, AI 기반 헬스케어, 의약품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실험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강점과 연결된다. 삼성전자는 남아공·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케냐 등에서 ICT·엔지니어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청년에게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는 동·남부 아프리카에 제조 및 혁신 거점을 확대하며 현지 일자리와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기차 조립, 모빌리티 솔루션, 교통 안전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투자나 수출을 넘어 아프리카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되고 있다.
동시에, 급증하는 아프리카의 청년 인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직면한 한국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AI·친환경 기술 분야의 직업훈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인턴십, 산학협력 등을 통해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은 인간의 존엄과 공정성, 포용을 중심에 둔다. 이 논의에서 아프리카는 주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한 세기를 규정할 AI 규범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공동 설계자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세계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온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함께 보다 공정하고 열린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결국 혁신이란 기계나 알고리즘의 발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부산의 강의실에서 나이로비의 스타트업 허브에서 함께 협력할 때 G20이 지향하는 미래(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강화하고 대륙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상호 이익,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급변하는 국제 질서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마주한 협력의 가능성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반하한 현실적인 과제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 인재풀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경제 구조의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프리카는 교육·기술·정책 경험을 가진 파트너를 통해 자국의 발전 전략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다.
올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를 처음으로 주최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을 지닌다.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기적같이 성장한 한국에게도,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가 단지 가치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실질적인 연결고리는 이미 하나둘씩 쌓여 가고 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과 연구, K-컬처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 그리고 기후·일자리·보건 등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논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야말로 어떤 정책 문서보다 단단한 협력의 토대다.
이 관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는 한국어 한마디 모른 채, '멀리 있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 하나로 바다를 건넜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군인이 아닌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두 대륙을 오가며 지식과 공감, 연대를 잇는 또 다른 다리를 놓고 있다.
곧 시작될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여국수원국, 중심주변이라는 오래된 틀을 넘어 대등한 파트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품위 있으며, 그리고 진정으로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할아버지가 믿었던 연대의 정신이자, 한국아프리카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 다음은 이스라엘 피세하 교수의 영어 버전 칼럼 전문.
Opening Perspective
When my grandfather, barely twenty-one, arrived in Busan in 1951 as part of the Ethiopian Kagnew Battalion, he carried nothing more than a soldier's uniform, a sense of duty, and the hope that his small act of courage might help protect a distant nation he had never seen. Before that three-week journey across the sea, he did not know the language, the people, or the land he would soon defend. Yet he felt an unmistakable convictionif peace was threatened anywhere, it mattered everywhere.
That conviction shaped the course of his lifeand eventually, mine. Decades later, I found myself walking through the streets of Korea as a scholarship student, and now as a professor at Kyungsung University. The country my grandfather once entered as a war zone has become my second home, a place where unexpected historical ties have grown into personal belonging. Every time I teach international students or welcome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nto my classes, I am reminded that the bridge my grandfather crossed was not only militaryit was profoundly human.
It is with this sense of lineage and responsibility that I look toward the upcoming G20 Summit in Johannesburg. This year marks the first time the G20 will convene on African soil, under the theme "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 For someone whose family story spans both continents, the symbolism is not abstract. It reflects a growing recognition that global leadership must evolve to match the shifting realities of our world.
Africa today i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n the planet. With 1.48 billion peoplea number projected to nearly double by 2050and a median age of just 19, it is the most youthful continent on earth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More than 60% of its population is under 25, forming a rising generation that is driving entrepreneurship, digital innovation, and cultural creativity at remarkable speed. Meanwhile,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now the largest free-trade area by participating countriesis reshaping economic integration across 54 member states.
These figures are far more than statistics. They represent the emerging global landscape that Korea will increasingly interact withespecially as Korea navigates one of the world's fastest demographic declines. As Korea enters what economists call a "super-aged society," Africa's young and expanding population stands not as a contrast, but as a complement: two regions whose strengths can reinforce each other, if approached with respect and a long-term vision.
Korea's own development story offers another point of resonance. Many African leaders and communities continue to study the Saemaul Undong, the grassroots movement that transformed rural Korea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self-help, and shared responsibility. What moves them is not a technical formula, but a lived example of how a nation once marked by poverty and war rebuilt itself through collective determination. As someone who teaches and researches across both histories, I often witness how these stories spark hope and imagination among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arrives at a moment when both continents stand at meaningful crossroads. Korea is searching for new engines of growth and broader global partnerships, while Africa is emerging as a decisive actor in global markets, climate responses, and innovation. The summit's theme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is therefore not simply a diplomatic slogan. It captures the deeper potential of KoreaAfrica cooperation, grounded in history, shared values, and a future that both sides are increasingly called to shape together.
Inclusive Growth Shared Prosperity
As the global economy undergoes profound shifts, Africa's increasing role is impossible to overlook. According to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continent's overall GDP grew by 3.2% in 2023 and is projected to rebound to 4.1% by 2025, outpacing many advanced economies. Even more striking is the rise of Africa's digital economy, which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stimates will add $180 billion to the continent's GDP by 2025. Across major hubs like Nairobi, Lagos, Kigali, and Accra, young developers and entrepreneurs are building solutions for mobile finance, renewable energy access, transportation, and educationindustries in which Korea possesses deep experience and cutting-edge expertise.
These economic transformations resonate deeply with Korea's own journey. Korea moved from a post-war economy to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technological nations in just a few decades. Its development was not driven by natural resources, but by people, education, and collective resilience. Today, Africa is experiencing a similar surge of human capital, with over 11 million young Africans entering the labor market every year (World Bank, 2024). This demographic momentum, if matched with the right partnerships and skills development, will shape the world's future innovation landscape.
For Korea, cooperation with Africa is not only a matter of economic opportunity but a strategic investment in inclusive global growth. Korean companies are already active in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manufacturing sectors across Africa. Yet the potential remains far greater than the current scale of engagement. The AfCFTA creates a single market of 54 countriesa scale Korean enterprises have rarely encountered outside of large regional blocs. With Korea's strengths in digital government, smart cities, green mobility, and manufacturing, the conditions are ripe for mutually beneficial expansion.
The spirit of inclusive growth also extends to education and talent exchange. Every year, a growing number of African students choose Korea for higher education, including many of my own students at Kyungsung University. Their presence enriches Korean classrooms, expands cultural understanding, and builds long-term bridges between societies. These young peoplefluent in both African realities and Korean innovationare the human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Supporting them is not only an act of solidarity; it is an investment in Korea's own global future.
Ultimately, inclusive growth is about ensuring that no nation is left behind in moments of global transition. Korea and Africa, each with their own histories of overcoming hardship, are natural partners in this effort. The G20 Summit offers a timely opportunity to strengthen this partnership, ensuring that economic progress is shared widely and equitably across continents.
Climate Resilience, Green Partnership Sustainability
Climate change is no longer a distant threatit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century. Its impacts are felt unevenly across the world, often striking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first. Africa, despite contributing less than 4% of global carbon emissions (UN Environment Programme, 2023), bears some of the heaviest consequences: prolonged droughts in the Horn of Africa, devastating cyclones in Southern Africa, and rising sea levels threatening coastal cities from Dakar to Dar es Salaam. These climate pressures affect food security, migration patterns, and the stability of entire regions.
Korea is not immune to these effects. Record-breaking heatwaves, intensified typhoons, and shifting seasonal patterns have become part of Korea's new climate reality. In this shared vulnerability lies a powerful truth: neither Korea nor Africa can face the climate crisis alone. Sustainability must b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the G20especially one held on African soiloffers a crucial forum for forging partnerships based on empathy, innovation, and mutual survival.
Africa possesses immense renewable energy potential.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stimates that the continent holds 60% of the world's best solar resources, yet only 1% of installed solar capacity is located there. Unlocking this potential would not only support Africa's development but contribute meaningfully to global carbon reduction efforts. Korea, with its expertise in solar technologies, green hydrogen, smart grids, and water management, is well-positioned to work with African nations in building climate-resilient societies.
There are already encouraging examples. Korean companies have partnered with African governments on solar mini-grid systems, digital climate monitoring, and coastal protection initiatives. Korea's Green New Deal and carbon-neutrality commitments also provide a policy framework that aligns naturally with Africa's climate priorities. But beyond technology and investment, what Africa often seeks is a partner that listens, respects local knowledge, and builds togethervalues deeply embedded in Korea's own experience of development.
Climate resilience is ultimately about protecting human lives and future generations. For Koreans facing demographic decline, and Africans shaping the world's youngest population, sustainability represents not only environmental duty but a promise that tomorrow will be livable, equitable, and shared. The G20 Summit in Johannesburg is a reminder that the climate struggle connects our destinies, urging Korea and Africa to walk side by side toward a greener and more resilient future.
Innovation, AI, Quality Jobs the Future of Work
As the global economy enters an AI-driven era, the gap between those who can access new technologies and those who cannot is becoming a new form of inequality. The G20's third sessionfocused on innovation, quality jobs, and a fair digital futuretouches a core truth: technology must serve people, not divide them. For Korea and Africa alike, this challenge is not theoretical. It is already shaping classrooms, workplaces, and the dreams of young people.
Afric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regions for digital adoption. According to the GSMA, the number of mobile internet users in Sub-Saharan Africa will reach 615 million by 2025, with smartphone adoption expected to surpass 75%. Cities like Lagos, Nairobi, and Kigali are emerging as vibrant innovation hubs, home to fintech pioneers, AI-driven health platforms, and drone delivery systems for medical supplies. This transformation aligns closely with Korea's own strengths in digital governance, smart manufacturing, and advanced research.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planted early seeds of this partnership. Samsung Electronics operates training academies in South Africa, Nigeria, Ethiopia, and Kenya, equipping thousands of young people with ICT and engineering skills. LG Electronics has expanded its innovation centers and manufacturing hubs across East and Southern Africa, supporting local jobs and technology transfer. Hyundai Motor Group collaborates with African institutions on mobility solutions, electric vehicle assembly, and safety training.
These initiatives are not only business endeavorsthey represent Korea's growing investment in Africa's technological future.
At the same time, Africa's demographic strengthits expanding youth populationoffers Korea something it increasingly lacks: a future workforce that is creative, ambitious, and globally connected. For Korean companies facing talent shortages at home, deeper cooperation with African partners can create pathways for mutual benefit: internships, joint research programs, vocational training in AI and green technologies, and industry-based skill exchanges.
Korea's "Global AI Basic Society" vision, introduced at APEC and carried into the G20, offers a framework where AI development centers human dignity, fairness, and inclusion. Africa must be part of this conversationnot as a peripheral participant but as a co-author of the digital norms that will shape the next century. Korea, with its experience of building an innovation ecosystem from limited resources, can walk alongside African nations in ensuring that the digital future remains open, fair, and empowering for all.
Innovation is not only about machines or algorithmsit is about giving young people the chance to imagine a better life. When Korean and African youth collaborate, whether in a classroom in Busan or a tech hub in Nairobi, they create the kind of shared future this G20 seeks to envision: a world where technology expands opportunity, strengthens dignity, and builds bridges across continents.
Mutual Benefits, Shared Future
As Korea and Africa stand before a rapidly changing global landscape, th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are not abstractthey are concrete, mutually beneficial, and deeply human. Korea gains access to new markets, new partners, and new sources of talent at a time when its ow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llenges require fresh ideas and global connectivity. Africa gains a partner with hard-earned development experience, advanced technologies, and a record of rising from adversity through education, innovation, and collective will. Both sides gain a friend that understands the value of resilience.
This year's G20 Summit in Johannesburg brings these opportunities into clearer focus. It is more than a diplomatic gathering; it is a symbolic turning point. For the first time, Africa's voice will host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economic forums. And for Korea, whose history includes memories of war, poverty, and miraculous transformation, this summit is a reminder that solidarity is not simply a valueit is a responsibility rooted in lived experience.
The threads that connect Korea and Africa are growing stronger every year. Korean companies are expanding in African markets; African students are learning, researching, and dreaming in Korean universities; cultural exchanges are deepening understanding; and shared challengesfrom climate change to job creationare awakening shared purpose. These human connections, far more than any policy document, form the real foundation of future cooperation.
I often think of my grandfather when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this partnership. He crossed oceans without knowing a single word of Korean, believing that defending peace in a distant land was worth the hardship. More than seventy years later, I cross these same lands not as a soldier, but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building bridges of knowledge, empath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ntinents that shaped my family's story.
As the G20 begins in Johannesburg, I hope Korea and Africa seize this moment to deepen their partnershipnot as donor and recipient, not as distant regions, but as equal partners walking toward a sustainable, dignified, and shared future. That is the spirit of solidarity my grandfather believed in, and the spirit that can guide the next chapter of KoreaAfrica cooperation.
2025.11.20
이스라엘 피세하 경성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을 꿈꾸며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이 영화로 다시 한번 'K-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대략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얼마의 제작 기간이 필요할까?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면 작업량은 1020배가 많아지고, 제작 기간도 24배 정도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16년 3월에 벌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IT 분야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보통 용어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과 저장 능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했던 의사결정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IT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사회, 정치, 교육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된 출발점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1998~2003) 중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IT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중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이제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 자리에 서 있다.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5 APEC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도입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적 발판을 마련하는 큰 의미 있는 성과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정책, 즉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10일에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 인재 등 다층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대학을 거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K-인공지능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택과목에 불과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이 담긴 체험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역량에 기반한 연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초등학교 3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의 일부분(출처=화중사범대출판사)
'아시아 AI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시아인들이 K-드라마, K-팝, K-음식에 얼마나 열광인지를 체험했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을 떠난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잘 발돋움하여 세계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그 경험을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20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을 꿈꾸며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올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개된 애니메이션 영화로 3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이 영화로 다시 한번 'K-문화'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대략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처럼 손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얼마의 제작 기간이 필요할까? 이전 방식으로 제작하면 작업량은 1020배가 많아지고, 제작 기간도 24배 정도가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현재 제작되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16년 3월에 벌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IT 분야의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보통 용어가 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를 비롯해 세탁기,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부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산업용 로봇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빠른 계산과 저장 능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했던 의사결정 단계까지 진입하면서 IT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은 사회, 정치, 교육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이 된 출발점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1998~2003) 중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IT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중등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우리는 이제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 자리에 서 있다.
'K-인공지능 교육'의 시작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면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천명하였다. 2025 APEC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도입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적 발판을 마련하는 큰 의미 있는 성과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정책, 즉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 10일에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의 확대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 융합 인재 등 다층적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 대학을 거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교육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K-인공지능 교육'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선택과목에 불과했던 인공지능 교육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 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 개념이 담긴 체험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 및 기본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등을 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인공지능 교과서를 보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과 인공지능 기반 교수 역량에 기반한 연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초등학교 3학년 인공지능 교과서의 일부분(출처=화중사범대출판사)
'아시아 AI 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발맞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진 K-인공지능 교육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보통 교육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하여 교육해야만 보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 인공지능 및 디지털의 지역·계층·연령별 격차와 공평한 기술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시아인들이 K-드라마, K-팝, K-음식에 얼마나 열광인지를 체험했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K-인공지능 교육의 출발점을 떠난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잘 발돋움하여 세계의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그 경험을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11.20
최현종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시작된 변화, 초저출생을 넘어 함께 돌보는 사회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줄을 서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인프라의 확장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2025.11.19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시작된 변화, 초저출생을 넘어 함께 돌보는 사회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줄을 서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인프라의 확장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2025.11.19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
 부동산 시장의 숨 고르기…'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올해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책에 이은 두 번째 충격요법이다.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 한도를 줄여 '똘똘한 한 채' 흐름에 제동을 걸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 효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급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부동산 시장의 '맷집'은 여전히 강하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구역'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최근 시장을 둘러보면 주택 유형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아파트 편식 현상'이 두드러진다. '아파트 키즈'로 불리는 MZ세대가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안은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시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민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거래와 가격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도 집값의 급등이나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 시장 안정이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 집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재로 보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비이성적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기고 과천지구(1만 가구) 사업 속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 관리는 두 갈래다. 하나는 수요 조절, 다른 하나는 수요 분산이다. 수요 조절은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 규제와 거래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주로 단기 처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인 수요 분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적 분산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산업의 분산이 핵심이다.
수도권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기저기 얽혀 있어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요 관리, 공급, 자금 분산, 국토 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시장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5.11.18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의 숨 고르기…'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정부가 올해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인 '10·15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책에 이은 두 번째 충격요법이다.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 한도를 줄여 '똘똘한 한 채' 흐름에 제동을 걸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 효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 급반등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1.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부동산 시장의 '맷집'은 여전히 강하다.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구역'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최근 시장을 둘러보면 주택 유형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아파트 편식 현상'이 두드러진다. '아파트 키즈'로 불리는 MZ세대가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졌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까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안은 언제든지 확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장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시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민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거래와 가격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도 집값의 급등이나 급락을 원하지 않는다. 시장 안정이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가 많다. 집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재로 보는 인식이 확산한 데다 비이성적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시점의 정책 방향은 공급과 수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를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
공급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 앞당기고 과천지구(1만 가구) 사업 속도를 높인 것은 바람직한 조치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살림집'이나 미니 아파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요 관리는 두 갈래다. 하나는 수요 조절, 다른 하나는 수요 분산이다. 수요 조절은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 규제와 거래규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주로 단기 처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인 수요 분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적 분산뿐 아니라, 지역 간 인구·산업의 분산이 핵심이다.
수도권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기저기 얽혀 있어 단일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수요 관리, 공급, 자금 분산, 국토 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시장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5.11.18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한미 '팩트시트' 타결…불확실성 해소와 제2도약 시작점
이번 '팩트시트'에는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2025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김필수 대림대 부총장(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한미 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과 안보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드디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통상과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서가 발표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된 부분은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합의돼 진행되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의 15% 대비 25%라는 높은 관세로 인한 부담으로 대미 수출에서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수출 품목은 물론 특히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적자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드디어 '팩트시트'까지 도출했다는 점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중요한 우리에게는 미국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매우 우려되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시작점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은 전체를 좌우하는 안정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30여 년의 국가적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확보라는 국민적 숙원을 단번에 해결하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
통상 분야의 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돼 합의를 증명하는 '팩트시트'가 없던 문제로 인해 2개월여 동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열악한 25%의 관세부과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비용으로 하루에 약 330억 원 이상을 소요하던 관세 문제가 드디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즉,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 관세 부과로 인해 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공정한 시작점 확보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 사안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 대비 한미FTA를 통한 2.5%의 관세 이점이 없고 없던 관세가 앞으로 15% 계속 부과되는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이미 글로벌 시장 기존 자체가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현 개선된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제작사는 미국 중심의 수출 체제를 개선해 미국 시장용 차량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생산 체제 증설과 더불어 국산 완성차의 수출 다변화와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제작사 대비 수익 구조는 물론 미래 친환경차 부품 체계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의 부품 생산 체계를 확실히 개선해 합종연횡(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거나 흩어지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의 산학연관 지원 체계도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상황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다. 지역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흔들리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수출과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주변의 도전 과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미래 비즈니스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해결 과제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공감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융합적인 국가역량을 모두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산학연관의 시너지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APEC를 통해 우리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 앞서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물론 미국과의 통상과 안보에 대한 최상의 결과 도출, 특히 민간 차원에서 최상위의 인공지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원 체제 도출 등도 우리의 제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긍정적) 정책을 네거티브(부정적) 기반으로 확대 전환해야 하고, 노사 간의 안정화와 법인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 등 다양한 현안도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 케이(K)-컬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전방위적인 선진 조건을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의 장점으로 극대화하고 앞서 언급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최고의 융합적인 미래 사업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이번 APEC을 통한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함께 이번 '팩트시트'의 합의서 도출은 크게 박수를 칠만 한 최고의 결과다.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어 유리한 상황을 최종 도출하는 결과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서에 없는 관세 소급 시점의 확실한 명시와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세부 항목 명시 등 확실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 협약의 급변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산업 조건도 크게 변하는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번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이러한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훌륭한 성과를 도출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
2025.11.18
김필수 대림대 부총장(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한미 '팩트시트' 타결…불확실성 해소와 제2도약 시작점
이번 '팩트시트'에는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2025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김필수 대림대 부총장(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한미 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과 안보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드디어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결과와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통상과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서가 발표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된 부분은 매우 다행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미 합의돼 진행되고 있던 유럽이나 일본의 15% 대비 25%라는 높은 관세로 인한 부담으로 대미 수출에서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든 수출 품목은 물론 특히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적자 구조를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드디어 '팩트시트'까지 도출했다는 점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중요한 우리에게는 미국을 시작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매우 우려되고 미래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도 불안감이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시작점으로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은 전체를 좌우하는 안정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더욱이 30여 년의 국가적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확보라는 국민적 숙원을 단번에 해결하는 시사점이 크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안보를 좌우하는 한미 동맹 대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명시돼 있어서 의미가 큰 합의다.
통상 분야의 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이 미비돼 합의를 증명하는 '팩트시트'가 없던 문제로 인해 2개월여 동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열악한 25%의 관세부과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비용으로 하루에 약 330억 원 이상을 소요하던 관세 문제가 드디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즉, 유럽과 일본과 같은 15% 관세 부과로 인해 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공정한 시작점 확보와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매우 환영할 사안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 대비 한미FTA를 통한 2.5%의 관세 이점이 없고 없던 관세가 앞으로 15% 계속 부과되는 점은 아쉬울 수 있으나, 이미 글로벌 시장 기존 자체가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현 개선된 시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제작사는 미국 중심의 수출 체제를 개선해 미국 시장용 차량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생산 체제 증설과 더불어 국산 완성차의 수출 다변화와 시장 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업계의 경우 제작사 대비 수익 구조는 물론 미래 친환경차 부품 체계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고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의 부품 생산 체계를 확실히 개선해 합종연횡(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거나 흩어지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의 산학연관 지원 체계도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상황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다. 지역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합의가 흔들리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다. 수출과 더불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주변의 도전 과제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미래 비즈니스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해결 과제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가적 공감대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융합적인 국가역량을 모두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산학연관의 시너지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APEC를 통해 우리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 앞서 언급한 한미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은 물론 미국과의 통상과 안보에 대한 최상의 결과 도출, 특히 민간 차원에서 최상위의 인공지능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지원 체제 도출 등도 우리의 제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한편, 우리는 사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 구조를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긍정적) 정책을 네거티브(부정적) 기반으로 확대 전환해야 하고, 노사 간의 안정화와 법인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 등 다양한 현안도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우리 케이(K)-컬처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전방위적인 선진 조건을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의 장점으로 극대화하고 앞서 언급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최고의 융합적인 미래 사업 조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이번 APEC을 통한 여러 분야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함께 이번 '팩트시트'의 합의서 도출은 크게 박수를 칠만 한 최고의 결과다.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어 유리한 상황을 최종 도출하는 결과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서에 없는 관세 소급 시점의 확실한 명시와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세부 항목 명시 등 확실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국제 협약의 급변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산업 조건도 크게 변하는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위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번 APEC과 한미 간 '팩트시트' 확정은 이러한 제2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훌륭한 성과를 도출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
2025.11.18
김필수 대림대 부총장(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문화가 국격이고 미래다…시정연설에 담긴 K-컬처의 시대정신
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AI'와 'K-컬처', 그리고 '방위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을 통해 향후 국정의 중장기 동력을 말하는 가운데, 새삼 눈에 띄는 것은 '문화(K-컬처)'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제 'K-컬처'는" 등 그동안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 경주에서 수시로 언급해 온 'K-민주주의'와 함께, 국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 펀드를 2000억 원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문화산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 둘째, 청년 세대를 '문화 생태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는 세대 감각. 셋째, 문화 정책을 복지·산업·외교로까지 확장하려는 종합 정책 의지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쇼)'에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등장인물을 형상화한 1,2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2025.9.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K-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통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순수 예술 및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문화 강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화 산업과 예술 지원, 관광 혁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문화 예산은 9조 6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8조 8000억 원 대비 8.8% 증가했다.
무릇 예산에는 당해 정부의 미래와 철학이 담긴다고 할 때 이를 통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문화는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나 기술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과 목표의식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기실 K-컬처의 골든타임이 도래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문화 정책은 사실상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 예산의 시의성과 선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각 정부의 정치적 기반과 정체성 그리고 국정 철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우선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기조 아래 문화를 국가 경쟁력 및 수출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쥬라기 공원과 현대차 150만 대"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지금도 소환된다. 임기 말 IMF 외환위기라는 '치명상'이 있었지만 문민정부는 '민주화'와 '문화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압축할 수 있다. 1999년에 들어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문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오늘날 '한류' 열풍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문화 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 분권과 맞물려 지방의 문화 정책 투자도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정권에 따라 지체되거나 역진(逆進)했다. 아직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악몽이 선연하다. 문화예산은 연속적으로 삭감됐고, 예술인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위협받았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비로소 전임 정부의 문화적 퇴행이 멈추고 국면 전환의 계기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양적 성장주의를 넘어 질적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척도는 일관성과 현장성이다.
예산은 액면보다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방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제2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등 구호성 업적주의가 눈에 걸린다. 한편으로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확산,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와 같은 대목이 보인다. 또한 우수한 공연·전시 기회를 지방에 충분히 제공하고 예술인 창작환경을 개선한다는 항목도 있다. 사실 이것들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진정성에 기대를 해도 좋을까.
또한 내실도 중요하다. 최근 국감에서 나온 얘기처럼 4년간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지점이다. 실제로 2022~2025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4000억 원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은 "예산만 불리고 실적이 없는 K-컬처 300조 원은 구호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디테일'이다. 예컨대 어떤 장르에서 펀드가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가? 2022년 기준, 드라마와 웹툰 분야는 빠른 회수율과 수익성을 보였지만,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장기적 회수가 필요한 구조여서 여전히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게임은 글로벌화 가능성이 크지만, 콘텐츠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고질적인 표절과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금 공급보다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는 투자 이전에 인식과 감수성의 문제다. 물적 기반만 늘려선 창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령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생계 걱정 없는 창작 환경"은 이러한 장기적 비전 속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정책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대는 언제나 예술을 필요로 하고, 정치가 그 예술의 발목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강국'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기예'라고 했다. "없던 길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문화정책은 바로 그런 '없던 길'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단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넘어,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감성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때마침 유네스코에서는 2026년 세계 기념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을 지정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는 것은 백범이 남긴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K-컬처의 시대는, 백범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신의 프로젝트다. 문화는 자본을 넘어 감성이고, 정치가 품어야 할 최후의 언어다. 국가는 그 언어를 책임져야 한다. 문화가 국격이고, 문화가 미래다.
2025.11.17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문화가 국격이고 미래다…시정연설에 담긴 K-컬처의 시대정신
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AI'와 'K-컬처', 그리고 '방위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을 통해 향후 국정의 중장기 동력을 말하는 가운데, 새삼 눈에 띄는 것은 '문화(K-컬처)'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제 'K-컬처'는" 등 그동안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 경주에서 수시로 언급해 온 'K-민주주의'와 함께, 국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K-콘텐츠 펀드를 2000억 원 확대하고, 청년 창작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문화산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 둘째, 청년 세대를 '문화 생태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는 세대 감각. 셋째, 문화 정책을 복지·산업·외교로까지 확장하려는 종합 정책 의지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한강 불빛 공연(드론 라이트쇼)'에서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등장인물을 형상화한 1,2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2025.9.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에 진입하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K-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통한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순수 예술 및 기초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문화 강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화 산업과 예술 지원, 관광 혁신 등 문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문화 예산은 9조 60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년도 8조 8000억 원 대비 8.8% 증가했다.
무릇 예산에는 당해 정부의 미래와 철학이 담긴다고 할 때 이를 통해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문화는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나 기술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과 목표의식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기실 K-컬처의 골든타임이 도래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문화 정책은 사실상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번 예산의 시의성과 선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각 정부의 정치적 기반과 정체성 그리고 국정 철학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우선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기조 아래 문화를 국가 경쟁력 및 수출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쥬라기 공원과 현대차 150만 대"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지금도 소환된다. 임기 말 IMF 외환위기라는 '치명상'이 있었지만 문민정부는 '민주화'와 '문화 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압축할 수 있다. 1999년에 들어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문화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섰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 오늘날 '한류' 열풍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문화 민주주의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 분권과 맞물려 지방의 문화 정책 투자도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정권에 따라 지체되거나 역진(逆進)했다. 아직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악몽이 선연하다. 문화예산은 연속적으로 삭감됐고, 예술인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위협받았다. 문화예술계는 이제 비로소 전임 정부의 문화적 퇴행이 멈추고 국면 전환의 계기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양적 성장주의를 넘어 질적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척도는 일관성과 현장성이다.
예산은 액면보다는 내용을 보아야 한다.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방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제2의 토니상, 노벨문학상' 등 구호성 업적주의가 눈에 걸린다. 한편으로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확산,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와 같은 대목이 보인다. 또한 우수한 공연·전시 기회를 지방에 충분히 제공하고 예술인 창작환경을 개선한다는 항목도 있다. 사실 이것들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진정성에 기대를 해도 좋을까.
또한 내실도 중요하다. 최근 국감에서 나온 얘기처럼 4년간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예의주시할 지점이다. 실제로 2022~2025년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 4000억 원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은 "예산만 불리고 실적이 없는 K-컬처 300조 원은 구호 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디테일'이다. 예컨대 어떤 장르에서 펀드가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가? 2022년 기준, 드라마와 웹툰 분야는 빠른 회수율과 수익성을 보였지만,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장기적 회수가 필요한 구조여서 여전히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게임은 글로벌화 가능성이 크지만, 콘텐츠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고질적인 표절과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자금 공급보다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는 투자 이전에 인식과 감수성의 문제다. 물적 기반만 늘려선 창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령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생계 걱정 없는 창작 환경"은 이러한 장기적 비전 속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정책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내건 'K컬처 300조'가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감수성과 실천적 제도의 설계가 필수다. 창작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 모두가 새로운 신뢰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 덧붙이자면, 예산이 곧 철학이라면, 이번 문화 예산 9조 6000억 원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꿈꾸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연설에서 나왔듯 '만파식적'의 피리소리처럼 세상의 파란을 잠재우고 조화의 선율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대는 언제나 예술을 필요로 하고, 정치가 그 예술의 발목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화강국'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기예'라고 했다. "없던 길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문화정책은 바로 그런 '없던 길'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는 단지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넘어,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감성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때마침 유네스코에서는 2026년 세계 기념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을 지정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는 것은 백범이 남긴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K-컬처의 시대는, 백범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신의 프로젝트다. 문화는 자본을 넘어 감성이고, 정치가 품어야 할 최후의 언어다. 국가는 그 언어를 책임져야 한다. 문화가 국격이고, 문화가 미래다.
2025.11.17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
-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이해관계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해 한국이 추진용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었다. 이번 합의로 그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한국은 실질적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며, 이는 해군력과 자주국방력 강화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원자력추진 잠수함+SLBM 체계'를 공식화하고 수중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발사 이전에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억제전력으로 기능한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역량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원전 기업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약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현실적 타당성이 전무한 비논리적 발언이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 전문 조선소로,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건조공장, 도크, 원자로 및 핵연료 취급시설, 방사선 차폐 설비가 전혀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모든 측면에서 국내 건조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지난 2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조선협의체(SCG :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를 조속히 설치해 건조 장소, 기술 교류, 핵연료의 합법적 사용 기준, 안전규범 등을 논의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기간과 비용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한국형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체계와 안전관리 규정이 상이하다. 이는 건조 설비와 핵연료 취급 체계의 호환이 어렵다는 의미이며, 미국 내 건조를 추진할 경우 양국 조선소에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 내 잠수함 공장을 신설하면 한국의 숙련 인력이 대거 파견되어야 하지만, 이미 국내 인력도 부족해 한국 조선산업과 미국 협력체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시작부터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고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한다면, 한국이 한발 양보해 '한국형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내 잠수함 정비 및 신조함 지연 해소를 한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한화가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정비·지원 설비를 구축해 미 해군 잠수함의 유지·보수와 일부 섹션 제작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MASGA(미국 조선산업 재건 구상)와 K-조선 르네상스 전략을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자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해법이다.
더 나아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국가 대형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예산, 외교가 긴밀히 연동되는 복합 사업이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방산기업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국책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조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잠수함 건조 예산은 단순한 국방비가 아니라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2025년 경주의 외교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인 자주국방력 향상으로 발전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의 완성이며,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다.
2025.11.13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이해관계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해 한국이 추진용 핵연료를 확보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었다. 이번 합의로 그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한국은 실질적인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번 결정을 환영했으며, 이는 해군력과 자주국방력 강화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원자력추진 잠수함+SLBM 체계'를 공식화하고 수중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발사 이전에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억제전력으로 기능한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역량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원전 기업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원자력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약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현실적 타당성이 전무한 비논리적 발언이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 전문 조선소로,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건조공장, 도크, 원자로 및 핵연료 취급시설, 방사선 차폐 설비가 전혀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발언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연속적으로 건조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모든 측면에서 국내 건조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지난 2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조선협의체(SCG : Shipbuilding Consultative Group)'를 조속히 설치해 건조 장소, 기술 교류, 핵연료의 합법적 사용 기준, 안전규범 등을 논의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과 설비 부족으로 기간과 비용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한국형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체계와 안전관리 규정이 상이하다. 이는 건조 설비와 핵연료 취급 체계의 호환이 어렵다는 의미이며, 미국 내 건조를 추진할 경우 양국 조선소에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 내 잠수함 공장을 신설하면 한국의 숙련 인력이 대거 파견되어야 하지만, 이미 국내 인력도 부족해 한국 조선산업과 미국 협력체계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시작부터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고 미국 내 건조를 고집한다면, 한국이 한발 양보해 '한국형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내 잠수함 정비 및 신조함 지연 해소를 한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한화가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정비·지원 설비를 구축해 미 해군 잠수함의 유지·보수와 일부 섹션 제작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MASGA(미국 조선산업 재건 구상)와 K-조선 르네상스 전략을 연계하는 상생 모델이자 양국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해법이다.
더 나아가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국가 대형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예산, 외교가 긴밀히 연동되는 복합 사업이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방산기업 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국책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조율,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잠수함 건조 예산은 단순한 국방비가 아니라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의 건조비용은 약 2~3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첨단 AI, 소재·부품·냉각재,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도약을 촉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응용 가능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2025년 경주의 외교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인 자주국방력 향상으로 발전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의 완성이며,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다.
2025.11.13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
-
 AI로 '소방시스템 혁신' 이끈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초거대 기술의 출현은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에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 여겨진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목표로 구체적 비전 수립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인 소방 분야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복합화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불허의 자연 재난은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초고층 건물·지하공간 재난 등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산업 발전과 도시 밀집화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을 통한 대응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중점추진정책'(이미지=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19상황실의 방대한 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와 장비를 자동 제안하는 '지능형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영상은 실시간으로 분석돼 즉시 지휘 본부로 전송되고, 인공지능은 변화양상을 예측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AI의 분석력이 결합하는 이상적인 협업 형태는 소방의 새로운 진화 모델이다. 또한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에서 무인소방로봇 시연 모델이 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소방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소방 연구개발 예산을 5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64.9% 증가한 규모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소방의 디지털 전환 가속력을 높이는 추력이자 강력한 의지의 방증이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 확대만으로는 안전의 혁신을 낙관하기 어렵다.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지난 9일은 예순 세 번째를 맞은 '소방의 날'이었다. 우리 소방은 기대와 다짐이 교차하는 이 순간, AI를 매개로 한 혁신의 전진을 선언하고자 한다.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이목이 '안전'과 '기술'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집중한 지금이 적기다.
2025.11.11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AI로 '소방시스템 혁신' 이끈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초거대 기술의 출현은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에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 여겨진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목표로 구체적 비전 수립과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인 소방 분야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복합화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불허의 자연 재난은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초고층 건물·지하공간 재난 등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산업 발전과 도시 밀집화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을 통한 대응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다.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중점추진정책'(이미지=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19상황실의 방대한 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고, 최적의 출동 경로와 장비를 자동 제안하는 '지능형 출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영상은 실시간으로 분석돼 즉시 지휘 본부로 전송되고, 인공지능은 변화양상을 예측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축적된 인간의 경험과 AI의 분석력이 결합하는 이상적인 협업 형태는 소방의 새로운 진화 모델이다. 또한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지난 8월 19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에서 무인소방로봇 시연 모델이 화재 진압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소방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소방 연구개발 예산을 5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64.9% 증가한 규모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소방의 디지털 전환 가속력을 높이는 추력이자 강력한 의지의 방증이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 확대만으로는 안전의 혁신을 낙관하기 어렵다.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재난 대응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민의 일상 가운데 견고한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AI 미래 기술의 옷을 입은 소방은 한층 진화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응 역량을 갖춰갈 것이다.
지난 9일은 예순 세 번째를 맞은 '소방의 날'이었다. 우리 소방은 기대와 다짐이 교차하는 이 순간, AI를 매개로 한 혁신의 전진을 선언하고자 한다. 국민과 정부 모두의 이목이 '안전'과 '기술'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집중한 지금이 적기다.
2025.11.11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
 왜 단어 하나에 밤을 새웠나 : 경주 APEC이 쓴 '미래의 문법'
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 경주의 '신라의 달밤' 아래 APEC 정상회의 관련 합의문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이 펼쳐졌다. 화려한 정상들의 만남 뒤편, 보문단지 한 호텔 지하 협상장에서는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를 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언뜻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단어가 바로 각국의 국익과 미래 전략을 담은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그 치열한 단어 싸움 끝에 'AI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동 합의에 바탕한 AI 이니셔티브를 도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사회(AI-Based Society) 구상과 맞물린 대표적 성과다. AI 이니셔티브는 정부·기업·스타트업·소비자가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역내 AI 능력 배양을 지원할 '아시아 태평양 AI 협력센터' 설립 추진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이 AI 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기술과 기업이진출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마지막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신호를 글로벌 시장은 즉각 감지했다. APEC CEO 서밋에 참석한 엔비디아는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31년까지 총 50억 달러 이상을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바라보는 명확한 신뢰의 표현이다.
긍정적 흐름은 AI를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전반으로 향했다. CEO 서밋의 부대행사인 '퓨처테크 포럼(FutureTech Forum)'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에서는 조선, 에너지, 방산뿐만 아니라, 바이오, 유통, 가상자산 분야 우수기업과 기술이 소개됐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APEC이 단순한 외교 무대를 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비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일즈'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가 추산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에 따른 7조 2000억 원의 파급효과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행사 개최에 따른 산업연관표상 투입산출계수에 기반한 계산에 가까웠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된 성과는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 AWS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7조 원이 'APEC 통해 소비된 돈'이라면 13조 원은 '행사를 통해 새롭게 벌어들인 돈'이다. 또한 화제가 된 엔비디아의 GPU 확보는 한국 정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외교·통상 측면에서도 성과는 뚜렷하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무역 안보 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과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으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금융과 무역 안정성을 높였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넓혔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도 개선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포스트 APEC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개최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미래산업이 결합된 지역 혁신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단기 경제효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상장 불빛 속에서 새벽을 맞아 합의문을 도출한 대표단은 APEC을 통해 드러난 한국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의 폐막 직후, 시장은 그 변화를 수치로 증명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4200선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심리 지수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외교가 지켜낸 '단어 하나'가 실질적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합의문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시킨 경험은 앞으로의 다자경제협력 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를 두고 밤을 새운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익의 언어이자, 미래의 문법을 써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주고받은 문안 한 줄, 한 줄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 산업 구조, 그리고 기술 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임의 룰'이 될 것이다.
2025.11.10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왜 단어 하나에 밤을 새웠나 : 경주 APEC이 쓴 '미래의 문법'
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 경주의 '신라의 달밤' 아래 APEC 정상회의 관련 합의문 도출을 위한 밤샘 협상이 펼쳐졌다. 화려한 정상들의 만남 뒤편, 보문단지 한 호텔 지하 협상장에서는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를 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언뜻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단어가 바로 각국의 국익과 미래 전략을 담은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그 치열한 단어 싸움 끝에 'AI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동 합의에 바탕한 AI 이니셔티브를 도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사회(AI-Based Society) 구상과 맞물린 대표적 성과다. AI 이니셔티브는 정부·기업·스타트업·소비자가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역내 AI 능력 배양을 지원할 '아시아 태평양 AI 협력센터' 설립 추진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이 AI 전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기술과 기업이진출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마지막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신호를 글로벌 시장은 즉각 감지했다. APEC CEO 서밋에 참석한 엔비디아는 한국에 26만 장의 GPU를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31년까지 총 50억 달러 이상을 국내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바라보는 명확한 신뢰의 표현이다.
긍정적 흐름은 AI를 넘어 한국의 미래 산업 전반으로 향했다. CEO 서밋의 부대행사인 '퓨처테크 포럼(FutureTech Forum)'이 대표적이다. 이 포럼에서는 조선, 에너지, 방산뿐만 아니라, 바이오, 유통, 가상자산 분야 우수기업과 기술이 소개됐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발표도 이어졌다. APEC이 단순한 외교 무대를 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비전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세일즈'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뒤따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가 추산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에 따른 7조 2000억 원의 파급효과는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행사 개최에 따른 산업연관표상 투입산출계수에 기반한 계산에 가까웠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된 성과는 이와 질적으로 다르다. AWS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것이다. 7조 원이 'APEC 통해 소비된 돈'이라면 13조 원은 '행사를 통해 새롭게 벌어들인 돈'이다. 또한 화제가 된 엔비디아의 GPU 확보는 한국 정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외교·통상 측면에서도 성과는 뚜렷하다.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는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무역 안보 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과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으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해 금융과 무역 안정성을 높였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넓혔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도 개선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포스트 APEC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개최지인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미래산업이 결합된 지역 혁신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단기 경제효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상장 불빛 속에서 새벽을 맞아 합의문을 도출한 대표단은 APEC을 통해 드러난 한국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의 폐막 직후, 시장은 그 변화를 수치로 증명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4200선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심리 지수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외교가 지켜낸 '단어 하나'가 실질적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10조 원이 넘는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스피 상승, 소비심리 회복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이번 2025 APEC은 외교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합의문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시킨 경험은 앞으로의 다자경제협력 전략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를 두고 밤을 새운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익의 언어이자, 미래의 문법을 써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주고받은 문안 한 줄, 한 줄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 산업 구조, 그리고 기술 협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임의 룰'이 될 것이다.
2025.11.10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